제1조 (목적)
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우리학교(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고객 또는 회원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의미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또는 회원)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이용고객을 말합니다.
2.이용고객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3.회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회원가입 신청양식(이하 “신청양식"이라 합니다)에 기재를 요청하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4.ID(고유번호)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비밀번호 : 회원의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포인트 : 회사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원에게 부여하는 재산적 가치 및 환가성이 없는 무형의 도구를 말합니다.
7.포스트 :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 또는 등록하는 부호(URL 포함), 문자, 음성, 음향, 영상(동영상 포함),이미지(사진 포함), 파일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이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15일전에 공지하고 개정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메일(e-mail)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4.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15일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이 가입한 유료서비스이용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서비스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6.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의 부지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이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이용고객이 전항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청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이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회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각종 정책(예 : 저작권 정책, 운영정책 등)과 수시로 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이용신청)
1.신청양식에 기재하는 회원정보는 이용고객의 실제정보인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이용고객은 반드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하 "실명"이라 합니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부정한 이용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인증 및 회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만14세 미만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타인의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ID는사전 통지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은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및 제한)
1.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이용고객에 대하여 업무상ㆍ기술상 지장이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합니다.
2.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 사용 등 신청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신청양식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자격상실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예외로 합니다.
⑥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이용하면서 신청양식에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
1.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2.회사의 업무상ㆍ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3.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상ㆍ기술상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4.회사는 서비스내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을 둘 수 있으며, 개별서비스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개별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1.회사는 서비스(개별서비스 포함)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2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회원의 ID와 닉네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과 협의하여 회원의 ID와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ID가 타회원과 중복되어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④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정전, 제반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④제휴업체와의 계약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4.회사는 만14세 미만 회원,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회원, 만 20세 미만의 회원, 외국인 회원, 법인 회원에 대하여 개별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한에 대한 사항은 개별서비스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11조 (컨텐츠 서비스)
1.회사는 유료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유료컨텐츠 서비스의 이용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료컨텐츠 서비스의 이용기한은 각 유료컨텐츠 서비스 세부이용지침에서 정하거나 각 유료컨텐츠 서비스 결제화면 등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유료컨텐츠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유료 컨텐츠서비스 이용잔여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컨텐츠를 다시 제공하거나 개별 서비스별 환불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2조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 및 청약철회)
1.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유료서비스의 이용료 결제,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2.회사가 제공하는 다운로드방식의 컨텐츠 유료서비스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로서 회사는 유료서비스 제공화면 또는 결제화면 등에서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3.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포스트에 대한 책임)
1.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내의 포스트(게시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단, 다음의 경우 회원 탈퇴처리 및 사전통보 없이 포스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③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④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회사가 정한 개별서비스별 세부이용지침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
⑥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⑦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⑧타인의 ID, 명의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⑨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⑩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별서비스별 세부이용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회사는 개별서비스별로 포스트(게시물)와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포스트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킴스보드,킴스온,킴스몰,실크로드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불만 및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포스트의 저작권)
1.회원이 서비스내에 게시한 포스트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회원은 자신이 서비스내에 게시한 포스트를 회사가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①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내에 입점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포함)내에서 포스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포스트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②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 포스트를 복제ㆍ전송ㆍ전시하는 것. 다만, 회원이 포스트의 복제ㆍ전송ㆍ전시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포스트를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포스트를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4.회원이 서비스에 포스트를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포스트를 서비스내에서 사용하거나 회사가 검색결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은 개별서비스내의 관리기능을 통하여 포스트의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제23조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포스트는 자동삭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의하여 스크랩, 펌, 담기 등으로 다시 게시된 포스트 및 프로젝트, 공유게시판, 댓글 등 공용 서비스내에 게재된 포스트 등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포스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6.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포스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포스트의 게재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포스트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6조 (포인트 이용)
1.회사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포인트를 양도, 대여 등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회사는 포인트 획득, 사용방법, 소멸 등에 관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이한 시기와 발생원인에 따라 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여 회원이 합산된 포인트 중 일부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의 차감 순서 또는 소멸시효기간 등은 회사가 결정하여 공지합니다.
3.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포인트 회수, ID 삭제 및 형사 고발 등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휴면계정 관리)
1.회사는 장기 비로그인 회원의 개발자계정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저장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휴면계정 관리정책을 실시합니다.
2.이용고객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6개월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연속하여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지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개발자 계정에 보관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 처리됩니다. 이용계약의 해지로 인한 데이터 또는 포스트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회원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회원의 회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지하고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따라 회원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운영합니다.
3.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9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3.회원은 신청양식 기재시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명의(또는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5.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회원은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7.회원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여받은 ID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회원에 대한 통지)
1.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발급한 또는 회원이 지정한 메일, SMS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이용)
1.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이용고객의 회원정보를 수집합니다.
2.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에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회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회원의 회원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회원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회사는 회원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회원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지합니다.
6.회원이 이용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에 제공한 회원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정한 바에 따르며, 회원이 이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제2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 등에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포스트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용계약해지 전 삭제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및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회원은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이용제한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3조 (손해 배상)
1.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면책사항)
1.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책됩니다.
2.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포스트의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5조 (분쟁 조정 및 관할법원)
1.회원은 포스트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문제제기 또는 문제해결은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행일자 : 2020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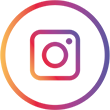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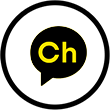
 이전글
이전글

